FORUM
블로그
수평적 조직문화란 뭘까요?
- 2023-09-04
- 291
갈수록 수평적 조직문화를 추구하는 회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직급을 없애거나, 호칭을 통일하거나, 영어 이름을 부르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렇게 하면 수평적 문화가 되는 걸까, 완전히 수평적 문화라는 게 조직에서 과연 가능할까 하는 회의적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수평적 조직을 영어 문헌에서 찾아보면 "horizontal organization"이라는 표현을 볼 수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이를 "flat organization", 즉 층고가 높지 않은 조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본래 12개 층으로 이뤄졌던 어떤 조직이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7개 층을 없앤 사례를 소개하면서 조직이 수평화되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흔히 MZ 세대들이 수평적 조직문화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MZ 세대가 기대하는 수평적 조직문화의 규범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1. 각 사람의 인격이 동등하게 존중되고, 취향, 신념 등의 다양성이 수용된다.
2. 조직 내에서의 공식적 위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조직 내에서 공식적 위계에 따라 의사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의 합리성, 타당성 등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위 "인격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 규범 중 1번과 2번은 인격적 평등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정말 직급, 호칭을 폐지하거나 통일하고 영어 이름을 부르는 등으로 상당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을 위해서는 기능적 불평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마다 각 사안에 대한 전문성, 경험, 정보 수준이 다릅니다. 레이 달리오는 <원칙>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각 참여자의 전문성에 따라 의사결정의 지분을 달리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조직이 과연 얼마나 평평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팀이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려면 수십 명을 넘어서면 어렵다는 점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맬컴 글래드웰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잠시, 누군가가 죽었을 때 당신을 진정으로 망연자실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전부 기록해보자고 했을 때 대다수 사람에게서 나온 평균적인 대답은 12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12명 정도의 이름들을 ‘공감 집단’이라고 불렀고, 글래드웰은 공감 집단으로 느끼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집단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영국 인류학자 로빈 던바(Robin Dunbar)는 인류학적인 문헌을 통해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50이라는 숫자는 진정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것 같다. 이런 종류의 관계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는 그런 관계이다.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을 때 초대받지 않은 술자리에 동석해도 당혹스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 숫자이다.” 그래서 이 150이라는 수를 가리켜 ‘던바의 수(Dunbar’s number)’라고 하죠.
던바는 조직에서 집단을 관리할 때 150명이 최적이며, 그 이상이 되면 조직을 둘로 쪼개는 것이 낫다고 했답니다. 사실 대부분의 인간 집단이 150명 정도로 구성되었다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군대도 약 150명을 기본 단위로 편성합니다. 던바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 친구가 1,000명이 넘는 파워유저조차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은 150명 정도이고, 그중에서도 끈끈하게 소통하는 사람은 채 2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스웨덴 세무 당국은 ‘던바의 수’ 원리에 따라 2007년 각 조직 단위의 상한선을 150명으로 하는 새로운 조직 개편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50명을 넘는 수천, 수만 명의 조직은 여러 층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최근에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이라고, 블록체인처럼 각 노드들이 네트워크로 엮여 있고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말하자면 중심이 없는 조직에 대한 논의도 있긴 하네요.
암튼 우리나라에서 "수평적 조직문화"를 원하는 MZ세대는 결국 "자율성"의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글: 비에스씨 연구소)
전체
글은 비에스씨 공식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sc_hr/223195328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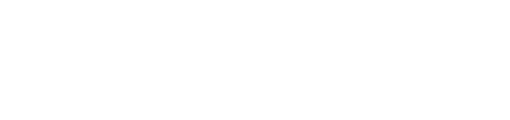
_21515.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