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
블로그
전형 단계에서 허들 방식이 나쁜 방식이라고요?
- 2023-06-07
- 1719

이 글에서는 채용 과정에서 각 전형 단계의 점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거의 80~90% 정도는 각 전형 단계의 점수를 허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즉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을 각각 독립적인 전형으로 하고 각 단계별로 제로베이스에서 점수를 측정해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방식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주는 사례로 양궁 대회 진행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래전부터 양궁 강국이었습니다. 예전 방식은 대회에 출전한 모든 선수가 여러 라운드에 걸쳐 많은 화살을 쏘고, 각 라운드의 점수를 전부 합산해서 종합 순위를 매기는 기록경기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대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실력이 뛰어난 한국 선수가 금은동을 휩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재미없다고 본 국제양궁연맹은 각 라운드마다 독립적으로 점수를 비교하는 세트제 방식으로 바꾸고 이전 라운드 점수를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한 번의 실수가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해 한국의 독주를 견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양궁의 실력이 워낙 탁월하니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하지만, 한 발이라도 삐끗하면 조기 탈락하거나 금메달 획득에 실패할 가능성을 항상 염려하게 되었고, 실제로 다른 나라가 종종 금메달을 따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허들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가 양궁 대회의 세트제 경기 방식처럼 앞 전형 단계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에게 역전의 가능성을 최대한 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앞 전형 단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의 우위를 없애버리는 선택입니다. 다시 말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지원자가 실수로 탈락할 가능성을 더 많이 열어 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선발 방법이라면 이전 전형의 점수도 합산해서 평가하는 것이 더 타당한 평가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보다 깊게 생각해 보자면, 단순히 전형 단계별로 합산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가 항목의 특성에 따라 합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채용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 항목은 합불(Pass/Fail)로만 평가하고, 어떤 평가 항목은 점수를 내어 총점에 합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인데요,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가 항목의 점수와 업무 성과가 정비례할 것으로 기대되는 항목은 총점에 합산하고,
최소한의 기준만 통과하면 되는 평가 항목의 점수는 총점에 합산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대기업 엔지니어 채용을 위한 면접관 교육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육 중 질문 시간에 신입 엔지니어를 뽑는 데 전공시험을 볼 것인가를 두고 면접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쪽은 ‘엔지니어가 전공을 모르고 어떻게 일을 하느냐’는 입장이었고, 반대쪽은 ‘어차피 들어와서 새로 다 배워야 하므로 전공시험은 필요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면접관 교육 강사가 ‘저는 인문계를 졸업했고, 회사에서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울 준비가 돼 있는데 제가 이 회사의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했더니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물었더니 물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어느 면접관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강사가 중학교 때 ‘F=ma’라든지 물리에 대해 좀 배운 게 있다고 했더니 다른 면접관이 열역학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바로 그겁니다.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꼭 알고 들어와야 하는 것,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반드시 검증하되 입사 후에 배워도 될 거를 미리 알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는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신입사원 채용에서의 전공 지식은 당락만 적용하고,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 게 타당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 영업사원에게 있어 제품 관련 지식은 일정 정도 허들을 넘지 못하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테스트를 해야 하겠지만,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고려하지 않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업을 더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제품 관련 지식 수준과 영업 성과가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품 관련 지식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허들만 넘기면 되는 역량을 한계 역량(threshold competencies), 점수 차이가 있으면 성과에도 차이를 낼 수 있는 역량을 차이 역량(differentiating competencies)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한계 역량은 과락을 적용하고 차이 역량은 총점에 합산해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채용이라면 허들 방식은 일단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의 성격에 따라 한계 역량을 평가한 점수라면 합불(Pass/Fail) 결정에만 활용하고, 차이 역량을 평가한 점수라면 가중치를 조정해서라도 계속 합산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검토: 곽정우 연구원)
이미지 출처: pixabay
전체
글은 비에스씨 공식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bsc_hr/222852825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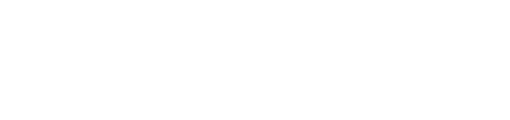
_502dd.png)

